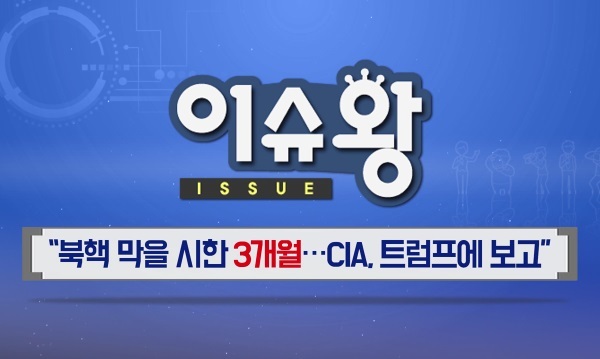칼럼&논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한에는 ‘북한 핵심과 선을 대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들이 백가쟁명을 이뤘다. ‘나한테 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보가 된다’는 이들에게 속아 오보를 한 기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돈을 날린 사업가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늘어가는 ‘중국 전문가들’에게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다. 자기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중국 권부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때로는 자신이 중국 당국자인 양 말하기도 한다. ‘저 양반이 만나는 중국인들은 별것 아니다. 내 것이 진짜’라면서 경쟁자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중국도 사회주의 독재국가요, 권력 내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일 수 있다. 어렵게 투자해 선점한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본능도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 내 대한(對韓) 여론과 한국 내 대중(對中) 여론을 호도하고 나아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2010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전문가 10명을 동원해 북한 체제가 중국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10가지로 조목조목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친중파를 자처하는 한 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왜 엉뚱한 일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느냐’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7년이 흐른 지금, 양식 있는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비슷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오해에도 소통 교란이 있었던 것 같다. 본보 화정평화재단과 일본 아사히신문,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지난해 서울에서 주최한 제14차 한중일 3국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지핑(胡繼平) 부원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기자의 호소에 “다른 한국인들은 ‘(우린 필요 없는데) 미국이 들여놓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인들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경색되자 일부 전문가는 중국을 배신하면 한국 경제가 거덜이 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문을 닫고 유커들이 발길을 끊었지만 한국 경제는 거덜 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은 오히려 더 늘었다.
사드 갈등이 ‘봉인’(한국 정부 주장)된 후 한중 간에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중국 측은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며 사드의 한반도 철수를 계속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른바 ‘3NO’를 약속했다고 우기고 있다.
합의를 하고 이를 왜곡해 선전하는 것은 강대국의 특성이다. 하지만 중국 측의 최근 행태는 좀 더 근본적인 대한반도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다.
최근 중국인들은 “한중이 형제처럼 지내야 한다”고 한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고 질문하면 “형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라고 말을 바꾸곤 한다. 지난달 3일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후 부원장에게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6·25전쟁 도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북-미 갈등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다시 쓴소리를 했다. 1년 전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의 그였지만 “당시 이승만도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21세기 국가관계를 서열이 정해진 인간관계로 치환하고, 명백한 문서로 입증된 6·25전쟁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하려면 그들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이들부터 결기를 가져야 한다. 작심하고 쓴소리 해야 겨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상대 아닌가.
신석호 국제부장 kyle@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13/87704471/1#csidxbfec95744493eb784898fdb3fbe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