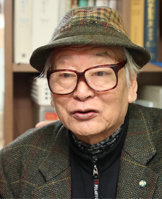내가 본 김병관

이낙연국무총리
나는 21년을 동아일보 기자로 살았다. 청년 시절부터 중년의 문턱 까지를 동아일보에서 보냈다.나에게 김병관 회장님은 늘 높은 분이셨다. 그 시기에 회장님은 동아일보 전무, 부사장을 거쳐 발행인, 사장으로 일하시고 회장에 오르셨다. 그 어른이 명예회장이 되시기 전에 나는 언론을 떠났다.
나는 김병관 회장님을 뵙기 힘든 처지였다. 어쩌다 뵈면 회장님은 무뚝뚝해 보이셨다. 내가 사람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증상은 그 시절에 심했었다. 그런 사정들이 겹쳐 나는 대체로 회장님을 무서워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여리고 외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알았다. 그것을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사실 회장님은 여리고 외로우셨던 것 같다. 회장님은 까마득하게 젊은 기자들에게 끝도 없이 술을 권하시며 당신이 더 많이 드시곤 했다. 때로는 ‘울고 싶어라’ 같은 청승맞은 노래를 한 서린 가락으로 부르셨다. 사모님을 먼저 보내신 뒤에는 혼자 우신 일도 많았다고 들었다. 당신이 무뚝뚝함 뒤에 감추려 하셨을 여리고 외로운 내면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훗날의 나는 생각했다.
왜 그러셨을까? 만약 그 어른의 내면이 여리고 외로웠다면, 그리고 그 어른이 그런 내면을 감추려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김 회장님께는 동아일보와 고려대가 인생의 거의 전부였다. 회장님은 동아일보와 고려대를 선대로부터 상속하셨다. 회장님은 동아일보와 고려대를 민족의 자산답게 지키고 키우면서, 동시에 그것을 상징하는 국가적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젊은 시절부터 강박처럼 품으셨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2년 후에 열리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1998년 김 회장님은 한국 신문경영인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나셨다. 그리고 2000년에는 21세기평화재단(화정평화재단의 전신)과 21세기평화연구소를 사재로 설립하셨다. 동아일보의 경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국악을 진흥하고 과학, 사진, 사이클 등을 지원하셨다. 동아일보가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웠던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마라톤을 줄기차게 육성하셨다.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한국 사회에서 신문과 대학은 때로 시련을 겪게 돼 있다. 시련 가운데는 승복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련이 합당하건 그렇지 않건, 지도자는 그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내색도 할 수 없다.
김 회장님의 무뚝뚝함과 그 속에 감추려 하신 것 같은 여리고 외로운 내면은 그런 복합적 환경의 산물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게됐다. 그것을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회장님을 덜 무서워하며 더 살갑게 모셨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성으로 회장님을 추억한다. 나의 남루하지만 소중했던 청춘을 쏟았던 동아일보가 더 고민하고 분발하며, 더 자랑스러운 창간 100주년을 맞기 바란다. 목록